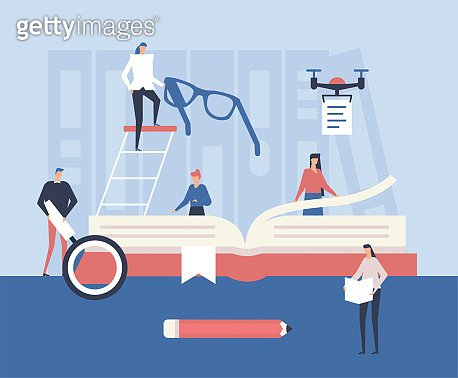
스마트폰과 SNS과 보편화되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더 글을 ‘스샷’이나 ‘짤방’보듯이 읽고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 행태를 고찰해보니 나 역시 그렇다. 내 딴에는 읽고 코멘트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단텔방에 올린 긴 글에 대해 바로 1분 후에 뭐라뭐라 떠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뜨악했다.
내 또래까지, 그러니까 문자매체의 기본값이 책이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정형화된 대답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을 그만 보고 책을 좀 더 읽도록 하자.” 출판계와 담론시장을 주도하는 건 내 연배보다도 더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그게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패드로 교과서나 소설을 읽고, 더구나 그림이나 노래가 첨부된 것을 경험한 친구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책에서 안정적인 경험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길인지 의심스럽다.
예전에 읽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분실한) <언어의 진화>란 책에서 ‘책에 대한 환상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다. 책은 제법 진화적으로 완결된 매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 책을 종이로 읽을 때엔 지금같은 매체 환경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 책에선 종이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금세 앞장으로 넘어오거나 밑줄 긋거나 접은 것들을 페이지로 넘기며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것 등을 언급했다. 이북에서도 기능적으로는 다 갖춰놓았지만 속도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다.
나는 그 독서경험에 이후 겪은 여러 가지 상황과 통찰 및 상념들을 버무리면서 ‘책’이란 매체를 ‘수레’에 비유하게 됐다. 이 네 바퀴 달린 탈 것은 텍스트라는 짐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수레를 끌면 들고 옮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율을 준다. 몇백 년전만 해도 가난한 유목민족의 십오륙세 소년에게는 자기 소유의 나무 수레가 하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재산이었을 거다.
‘책’이란 매체가 이름은 바뀌지 않은 채 급속도로 사이버로 뛰쳐나가는 현상은 비유하자면 수레가 마차로, 심지어는 자동차로 급진화한 상황에 해당된다. 수레를 끄는 소년시절을 보냈던 어른들은 이 황당한 물건들에 기함을 한다. ‘저걸로 이동을 하면... 물건을 옮기면... 신체단련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라고 말이다.
이 비유를 좀 더 끌고 간다면 이렇다. 자동차가 발명된 세상에서 수레를 이동과 운송의 기본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레도 종종 필요하지만, 쓰임새는 한정된다. 오늘날의 많은 핸드카트들은 심지어 자동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안락함에 빠져 신체단련을 게을리한다면 수레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 쉬이 비만체형이 될 것이다. 핵심은 문명의 이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기본기를 지키는 삶의 기술이다. 자동차 이후의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의식적으로 운동해야만 한다.
내가 이 비유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자동차를 타는 인간들은 더 이상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을 운동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수레시대엔 수레를 끄는 것이 실용적이면서도 운동을 하는 길이었다. 이제는 아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수레 시대 이전의 기본적인 동작들, 걷기·달리기·근력 운동(물건 들어 올리기 및 옮기기)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스샷’이나 ‘짤방’으로 보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한 친구들에겐 ‘책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수레시대보다 더 원초적인 예전으로,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테면 낭송, 독송, 암송, 함께 읽은 후 그룹토의와 같은 것들 말이다.
뇌과학이나 교육학 등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직관과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게 될 것만 같다.
미래는 모르지만,,, 아주아주 먼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후 정도가 아니라면 종이책은 가장 탁월한 텍스트 매체로 왕좌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전자책에 환호하며 종이책은 곧 없어질 거라 말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책 천 권을 쌓아두려면 어마어마한 책장이 필요하지만 전자책은 단말기 하나에 천권 넘게 들어가며, 여러 편리함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그땐 책을 그저 지식습득 수단이나 정보보관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책을 천권 정도 읽고 나니, 아~~~ 책은 정보를 보관하는 도구도 아니고,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도 아니더군요. 여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잘 기록해뒀습니다. ^^